최영수가 쓴 콩뜨 <家屋哲學> - 朝光 (1939년)
1939년 조선일보사출판부가 펴낸 <조광>이란 잡지에 수록된 최영수의 꽁뜨 <家屋哲學>으로
당시 복덕방 주인의 농간과 집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가옥철학(家屋哲學) (1)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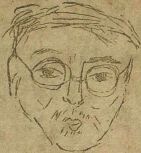
(白民, 1948년 1월)
최영수(崔永秀) (2)
「집이란 군신좌사(君臣佐使)가 쳑 들어 마져야 하고 좌처가 그럴 뜻해야 하고 비록 셀뒤겻(좁은 뒷겻)이나마 있어서 뒤가 휑하니 돌아야 하는 법이며 대문을 쳑 들어스면 안채가 번듯하고 석재가 그럴 뜻해야 할게고 굴돌이 돌아야 하며 또 대문은 으례 동향(東向) 대무니래야 하며 안채는 남향관이어야 되고 안방은 서상방(西上房)이야 하며 밥을 듸리퍼야 하고 하수도가(下水道)가 남의 집을 거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집이 구석집이면 값이 안 나가는 법이니라.」
비록 오막사리라도 내 집 하나를 지니고 살겠다든 오랜 숙망이 우연히(참으로 그 신세가 우연히 가게 된 싀집처럼) 집 하나를 장만하게 된 행운의 날이 닥쳐왔는지라 새로히 작만해야 할 집을 탐색하든 전야에 나는 이러한 가옥학(家屋學)을 그 어떤 노교수(老敎手)에게서 강의를 받었고 이 필기 옆에다가 나의 신가옥학설(新家屋學說)을 첨가해 놓았다.
「거기다가 공기가 좋고 문전(門前)이 깨끗해야 하고 집이 문화절충식이어야 하고 수도가 있어야 하며 기둥이 높아야 하고 행랑이 없어야 하며 장뚝이 뒤로 살짝 물러 앉고 교통이 편해야 하며 반듯이 진지 三四년 밖에 안되는 신옥(新屋)이래야 한다.」
<참조>
(1) 이것은 당시의 가옥에 대한 상황을 묘사한 꽁뜨의 하나이다.
(2) 최영수(崔永秀 1909-?): 만화가로 도쿄 가와바타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33년 6월 동아일보사에 입사해 신동아에 근무하면서 한 칸짜리 연작만화 등을 그리며 생활 속에 스며있는 흥미거리로 잔잔한 웃음을 주는 작품을 그렸다. 1935년에 발표한 그의 대표작 '만화자가 본 세상단편' 연작은 1930년대 신변잡기 만화의 걸작으로 꼽힌다.
그는 만화비평도 발표해 조선 만화가 민중예술로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노력했고, 그 일환으로 1938년 잡지 "만화만문"을 창간했으나 곧 종간됐다.
1945년 8월부터 경향신문사에 근무하다가 한국전쟁 중 납북됐다.
1949년 수필집 "곤비의 서"(경향신문사 출판부)를 내며 자신이 책의 장정과 그림을 곁드렸다.(박대헌, 우리 책의 장정과 장정가들, 열화당, 1999년) (1) 이것은 당시의 가옥에 대한 상황을 묘사한꽁뜨의 하나이다.
초갓집은 전액지불(全額支拂)한 지 열흘, 기와집은 보름-이것이 법률이 제정한 가옥매매에 부수하는 명도기한(明渡期限)이라는 법적조목을 서너줄 더 첨가한 이 한 권의 필기장을 가슴 우에다 고요히 놓고 두러 누은 나의 머릿 속에는 잠시 서울 장안 수만채의 기와집이 들락날락 하였고 팽패돌아 나잡바지는 집과 집 속에 오열하면서도 행여 나의 지닌 가옥철학의 시험에 락제점을 면할 만한 집들을 골르고 골라 다행이 그러한 집이 발견되면서 눈이 띄어지고 눈을 뜨자 나는 다만 내 집도 아닌 한 채의 집 속에 누어 하로 밤을 자는 어제 그대로의 나이었음을 느끼면서 가슴 우의 필기장을 제쳐 암송하기에 애쓰곤 하였다.
이튼날-허구한 날을 지나다니면서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내버렸든 복덕방(福德房)을 다시 주읍기 시작하였다.
누구나 복덕방 하면 그 누-런 베흔겁의 매달린 간판을 생각할게고 또 그 안에서 담배와 씨름을 하고 쭈구랑 밤송이 영감님들을 연상할게며 그 영감님들의 뒷짐 짓고 앞서 골목을 헤염치는 자연히 규정된 ‘타잎’을 그리듯이 나도 이 처음 당하는 일을 앞두고 복덕방을 향하야 거니른 거름 거름마다가 되푸리 시켜주는 사이 복덕방에를 당도하야 굴둑같은 방으로 얼굴을 쑥-디미렀다.
“집하나 봅시다.”
“무슨 집요?”
“아 집도 맨집이지 당신이 소용되는 거말요?”
“알면 무르러왔겠소?”
“앗다 그 젊은이 말귀도 어둡구려. 아니 집이란 정방(어디쯤으로 정하겠느냐 말이렀다)이 있어야 하는 게고 또 소용되는 칸수가 있어야 하는 게고 그리고 가격은 얼마 정도라든지……”
“네 알겠오이다. 거 단 내외 살게고 또 어디든지 집만 마땅하면 좋-죠.”
“한 사백원짜리 하나 보실려우? 열두간반이요 평수는 열여덜평 오합팔재인데-”
“사백원요?”
“아니 비싸우? 힘에 겨우슈?”
“아-니 사백원째리 집이 어데 있어요? 그렇게 싼 집이?”(이 말씀 반은 입속에서 굴른 소리다)
떡버러진 입, 팽 도는 머리, 툭 솟아나온 눈-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집주름의 뒷짐진 뒷모양을 흉내내며 딸아갔다.
번듯한 집이다. 깨끗한 집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나의 가옥철학(家屋哲學)에는 위반점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집을 당장 사기로 결심한 것이어서 집주름(3)을 끌고나와 서는
댓짜고짜 계약하고 전액을 당장 다 치기라도 하겠다고 더덜거렸다.
(3) 집주릅이라고도 하는데 일본말로 가옥을 매매하는 중계인을 뜻한다. 한자로는 家僧이라고 쓴다.
약간 당황한 나의 표정을 이상히 보드니 그는 주머니에서 오구락 오구락하며 조이쪽을 꺼내 펴는데 그게 계약서 용지였다.
“이게 웬떡이냐! 집 하나 흥정 붙일려면 고무신이 너덧 켤려는 해지고 셋바닥이 세치는 달을 만큼해도
어려운 건데 이렇게 담번에 흥정이 되니 오늘 재수 괜찮은 걸-아 이래서 이 노릇을 구만두자-구만두자-해두 못 놋는단말야.”
필연 이렇게 뱃속으로 독백(獨白)을 하는 모양이어 그 종장(終章)이 슬적 변해서 내 어깨를 치며 내쏟는 말이
“거 젊은 양반이라 참 씩씩하외다. 담번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겝니다. 집을 많이 보면 나종에는 집에
홀려서 집 못사는 법입넨다. 그저 내외 살림 이만하면 똑 알맛죠!”라고 하면 집안으로 들어가드니
집주인과 수군수군-조곰 있으니
“안빵에 손님이 많이 오셔서 좀 않되었다구 우리 복덕방에 가서 계약하자구 그럽니다. 어서 이리루 오슈!”하며 내 손을 이끄는 양 그 다정스러움이 여간이 아니었다.
복덕방 노인이 두 사람, 집주인이 한사람, 내가 거기 껴서 모두 합쳐서 네 사람이 가장 엄숙한 얼굴로 무릎을 맞대이고는 좁디 좁은 반칸방에 들어 앉았다. 집주름의 소개로 집주인과 나와의 인사가 또한 의미없는 엄숙리에 진행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집주름의 계약서 랑독이 있고 그리고 나서 글씨깨나 쓰는 듯한 옆자리의 노인이 몽탕철필대를 모필들듯키 잡고서 돕배기 밖을 두 눈을 깔아 굴린다.
나는 속으로 간혹 신문지상에서 엿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무슨 조인식(調印式)이 이러하리라 가상을 하면서 일층 더한 긴장을 돋우어가며 나의 시선은 노인의 철필끝을 따라 좁은 계약서를 헤메였든 것이다.
“그러니깐두루 오천원 이군 그래!”
“뭐요?”
나의 사지에 전율할 소름이 확 끼쳤다.
“아니 그럼 얼란마말슴요?”
“아까 말슴은……”
“그러니까 오천원 아님네까?”
“아니 아까 말슴하신 것은……”
“허-그냥반- 아니 그럼 얼마요? 오천원이지!”
“난 아까 듣기를……”
“열두간이면 사천팔백원에 거기다 반칸 값을 넣으면 꼭 외누리 없는 오천원……그렇죠?”
집주름은 말꽁문이를 슬적쳐들면서 집주인을 도리켜 본다.
“글세 나도 그렇게 생ㄱ가하는데 저냥반은 아니시라니 어떻게 따지신심인지 몰르겠는걸요?”
집주름의 얼굴을 맞쳐다보면 집주인이 심히 답답한 듯이 한마디 대꾸를 내놓았다. 이 말을 받어 가지고는 집주름의 담뱃대가 내 앞을 서너치 남기고는 치밀면서
“여보슈 웨 어데가 틀리오?”
철필을 든 노인은 엉거주츰 하고서 다서 五자를 붓끝에 매단 채 날 쳐다보는 입이 벙벙한 모양이다.
나 역시 어찌된 양문을 몰랐다. 아까 말하기를 사백원이라고 했는데 뷸시에 오천원 소리를 드르니 뺨맞인 오뚝이 모양으로 정신이 얼떨떨한데다가 주의의 눈들이 내게로 응소(應召)를 한 양 처밀리는지라 가다 멈춘 시계바눌같이 표정 없는 얼굴을 버틔고 있을 뿐이었다.
“허-잘 생각하쇼. 자-어서 써요 오천원야라-그리고-계약금은 얼마를 내실려는지 집값의 일활이니까 오백원 내실테지……”
두는 집주름 말을 받어 다시 五짜가 막 계약서 우에 떨어지려는 기막힌 찰라에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니 아까는 사백원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오?”
“그래요!”
“그런데 웬……”
“허-참 그 분 답답하군 그래, 아까 집 사겠다고 할 떼는 싀원핟느 분이 지금와선ㄴ 어째 그리도 답답하슈?”
“아니 말이 달러도 분수가 있지 그래……”
“말이 달르다니요? 아니 그래 매 칸에 사백원씩이니 열두간반이면 댁은 얼마란말요>”
“매칸에?”
“…………”
“매칸이라니요?”
“한칸에 말요 웨 그럼 집 한 채에 사백원인 줄 알으셨읍디까?”
“난 더퍼 놓고 이 집은 사백원이라기에……”
이야기는 여기쯤서 끄치거니와 하여간 흐정은 산산 조각이 나서 깨어지다 못해 으스러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인사하나 건지지 못한 채 꽁문이를 툭툭 털면서 줄행랑을 불렀다.
때는 거리의 전등이 얼마 않있어 밤을 불르려는 저녁 가까이……분주한 왕래인의 틈으로 멀리 복덕방을 도리켜 보니 포장은 어느 새 걸이었고 뒷짐진 늙은이 서넛이 몰켜나와서 옆골목으로 드러가는 것을 보며 도리켜 주머니에서 나의 가옥철학 필기첩을 꺼내어 보았으나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는 “집값은 매칸을 단위를 호가(呼價)하는 법이니라”의 일항(一項)이 확연히 빠져 있는 것이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베우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라고.(了)
출처: 朝光, 조선일보사출판부, 1938년 12월(4권 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