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당시 피난시절 이야기
fabiano
이야기
2
1456
2007.08.29 0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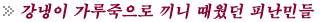
6.25동란 때 정든 고향을 등지고 부산으로 밀려 내려 왔던 피난민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다.
한겨울에도 불을 지필 수 없던 얼음짱 같은 수용소 안에서 부모가 또는 자식이 얼어서 숨져 가는 것을 보고도 단장(斷腸)의 슬픔을 되씹고 있어야만 했다.
굶주림 따위는 아예 예사로운 것이 피난민들의 생활상이었다.
그래서 피난민들은 닥치는 대로 어떤 일에든지 뛰어 들어 밥벌이에 나섰다.
부두 노동, 공사장 목도꾼, 허드렛꾼, 지겟꾼, 노점상 등으로 피난민들은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루살이 벌이에 나섰다.
그래도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에 어려워 별의별일에 다 손을 댔다.
미군 부대에서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끌어 모아다가 끓여 파는 『꿀꿀이 죽-일명 유엔탕』장사, 내다 버린 미제 깡통 빈 것을 주워 모아다가 반반하게 펴서 끼워 맞춘 것으로 판자집 지붕을 이어주는 『깡깡이』 장사,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를 주워 다가 땔감으로 파는 전마선업(傳 馬船業), 철길가에 버려진 코크스를 주워 다가 땔감으로 쓰거나 파는 일, 때로는 철도 화차에서 석탄을 잽싸게 훔쳐 다가 땔감으로 파는 일, 골목골목 누벼 다니며 머리를 깎아 주는 떠돌이 이발사 등이 피난들이 해내고 있던 밥벌이였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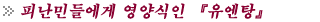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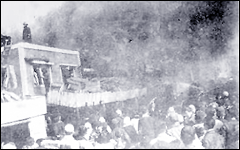
6.25 동란 무렵 피난민들이 가장 수월하게 나설 수 있던 직업은 부두 노동이었다.
그것은 아무런 기술 없이 뚝심만 있으면 되는 짐꾼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군수 물자며 원조 물자들이 날마다 산더미로 부산항에 실려 들어왔기 때문에 일손이 크게 딸렸었다.
한창 바쁠 때는 밤낮으로 5만 명이나 되는 노무자들이 개미떼같이 달려 들어 비지땀을 흘려 짐을 날랐어도 못다하는 것이 부두 노동이었다.
그래서 피난민들은 새벽같이 부두로 나서서 줄을 서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일꾼으로 뽑혀 들 수 있었다.
따라서 피난민들치고 하다못해 한 두 달쯤 부두 노무자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피난민들 가운데는 대학을 나와 교사였던 사람, 회사원이었던 사람, 떡 벌어지게 사업을 경영하고 있던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부두 노동이라는 것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다.
꼭두새벽에 별을 이고 판자집을 나섰다가 온종일 쉴새 없이 짐을 져 나르던 끝에 땅거미가 깔려야 부두에서 빠져 나와 별을 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짐이 밀리면 밤을 지새면서 짐을 매어 날라야만 했다.
그러니 어깨가 미어지고 뼈가 어스러지는 아픔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 부두 노동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책상머리에서 서류나 뒤적이던 화이트 칼라 족에게는 모진 형벌과도 같은 것이 부두 노동이었다.
따라서 그런 피난민들은 식구를 먹여 살릴 일념으로 처음에는 이를 꾹 다물고 버티어 나가다가도 1주일도 못 가서 고통을 참다 못해 물러 서고 말았다.
배에 기름기라고는 없는 바짝 메말라 있는 피난민의 처지에서 고통스러운 부두 노동을 참아 견뎌 내기란 무간지옥(無間地獄)의 고통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 피난민들에게 <꿀꿀이죽>은 더없이 달디단 영양식이 돼 주었다.
점잖고도 익살스러운 말로 『유엔탕』이라고도 불렀던 『꿀꿀이죽』에는 유엔군 병사들이 먹다 남은 기름진 쇠고기 살점도 어쩌다 새알심처럼 섞여 드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행운까지야 바라지 않더라도 『유엔탕』은 노리끼하고 구수한 고깃국 맛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유엔탕』을 파는 쪽에서도 그것을 사먹는 쪽에서도 스스럼없이 떳떳하게 떠주었고 받아 먹었다.
이런『꿀꿀이죽』한 그릇을 먹고 난 피난민들은 꺼져 들어갔던 눈이 쑥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나흘에 한 번씩 이나마 그런 영양식인 『유엔탕』을 사먹는 일조차도 피난민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고되기 그지없는 부두 노동에서 얻어지는 수입이라고는 하루 품삯이 최고 2백50원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 능력에 따라 『우(優)』, 『양(良)』, 『가(可)』의 차례를 먹였던 가운데서 최고 노임인 『우(優)』가 2백50원이었고, 『양(良)』은 2백20원, 『가(可)』는 2백원이었다.
『우(優)』등급에 해당하는 부두 노무자는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 목선(木船)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양(良)』등급에 해당하는 노무자는 육상 또는 부선(浮船)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가(可)』 등급에 해당하는 노무자는 청소와 잔일 마무리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어떻든 『우(優)』등급에 해당하는 부두 노무자조차도 2백50원의 하루 품삯으로는 『유엔탕』 한 그릇을 사먹기가 어려웠을 만큼이나 부두 노동 품삯은 싸구려였던 것이다.
그런 싸구려 품삯을 받아 뼈가 으스러지게 한 달을 내내 일해도 그 수입은 고작 6천~7천원 남짓에 지나지 않았다.
일거리가 한 내내 짐을 나를 수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했고, 비바람이 불어 닥치는 바람에 그런 싸구려 품삯 벌이조차 공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일 같이 치솟는 물가(物價) 때문에 피난민들은 밥 먹듯이 굶어 지내기가 예사였다.
6ㆍ25 동란 직후 한 되에 6백원이던 쌀값이 그 반년 뒤인 1951년 1ㆍ4후퇴 무렵에는 9백원으로 치솟았는가 하면, 그 뒤 다시 다섯 달 만인 5월에는 1천6백원으로 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
딱 1년 만에 쌀값이 266% 남짓이나 솟구쳐 올랐던 것이다.
그런데도 부두 노무자 품삯은 한푼도 오르지 못했고 내내 제자리 걸음이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쌀 한 말을 근근히 팔아 들일 수 있던 한 달 품삯이 나중에는 너댓되 거리 품삯밖에 되지 못했다.
그런 싸구려 품삯이나마 벌려고 악착같이 부두 노동판에서 일해 나가고 있던 피난민들 가운데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쩌다 발을 헛디뎌 한겨울 바다에 빠져 들었다가 동태로 얼어 죽는가 하면, 탱크나 차량이며 기계류와 같은 무거운 짐을 부려 내리다가 너댓 사람이 그 밑에 깔려 애꿎게도 비명횡사하는 일도 있었다.
천행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해도 척추신경마비로 평생을 누워 지내게 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팔다리가 잘려 나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무자들에게는 보상금 한푼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참으로 서러운 피난살이 부두 노무자들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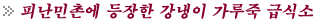

가장(家長)인 사람에게만 매달려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던 피난민들은 있는 식구대로 모두가 나서서 밥벌이를 해야만 했다.
아낙네고 아이들이고 해내기가 그런대로 수월했던 일거리는 철길가로 나가서 코크스를 주워 다가 파는 일이었다.
품질이 좋은 코크스만 골라 한말들이 석유통에 고봉으로 채워 팔면 5백원씩 받을 수가 있었다.
대여섯 식구가 몽땅 나서서 코크스 장수를 한다고 치면 하루에도 2천5백원~3천원을 벌어 들일 수 있는 수월찮은 장사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품질이 좋은 코크스를 골라 한말들이 석유통을 채우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다가 피난민들이 너도나도 코크스 줍기로 나서는 바람에 더욱이 어렵게 됐다.
게다가 그나마도 비바람이 몰아 치는 날이면 코크스 장사도 공치는 날이 돼 버렸던 것이다.
한창 철없이 마구 뛰어 놀아야 할 코흘리개도 미제 껌 장수로 나서야만 했던 것이 6ㆍ25동란 무렵의 서러운 피난살이였다.
소중한 자식을 껌 장수로 내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조차 대줄 수 없던 것이 서러운 피난살이 부모들이었다.
더구나 코흘리개들만 껌팔이로 나섰던 것이 아니라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까지 껌팔이로 나섰다.
이와 같은 떠돌이 껌팔이는 오늘의 중구 지역에 몰려 있던 다방거리에 유난히도 많이 헤매 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있는 식구모두 닥치는 대로 밥벌이를 나서도 입에 제대로 풀칠해 나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이 예사로 하고 있던 피난살이 집안 사람들에게 더없이 고마웠던 것은 가톨릭이며 개신교 개통의 난민구제회(難民救濟會)에서 피난민촌에 내고 있던 급식소였다.
여기에서 내주었던 것이라곤 강냉이 가루죽 뿐이었지만 그나마도 주린 배를 움켜 쥐고만 지냈던 서러운 피난살이 형편에서는 꿀맛과 같은 죽이었다.
아무리 섧다섧다 해도 배고픈 설움보다 더한 것이 없던 피난민들에게는 오로지 주린 배를 채우는 일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런 강냉이 가루죽에는 유니세프(국제연합 아동 긴급 구제기금)에서 원조해주는 분유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피난살이 어린이들이나 노인네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영양식이 되기도 했었다.
영주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일대의 산비탈 피난민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가 이 강냉이 가루죽을 주식(主食)으로 기대고 있었다.
그나마도 하루에 낮 한끼거리로만 주었던 강냉이 가루죽으로 주린 배를 달랬던 것이 눈물겨운 피난살이였던 것이다.





